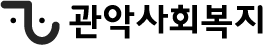레비트라 50mg구입, 불타는 연인 리부트 시즌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주랑남 작성일25-11-20 10:36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19.cia351.com
9회 연결
http://19.cia351.com
9회 연결
-
 http://57.cia312.net
9회 연결
http://57.cia312.net
9회 연결
본문
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레비트라 50mg구입으로 연인 관계 회복, 비아그라구매 사이트
불타는 연인 리부트 시즌2
오랜 연인 사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생활은 자주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비트라는 단순한 발기 보조제가 아닌, 남성 자신감과 사랑의 온기를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비아그라 구매, 하나약국, 비아마켓, 골드비아 등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비트라의 성분과 작용
레비트라 50mg구입의 핵심 성분은 바데나필Vardenafil입니다. 혈관을 확장하고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촉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강한 발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복용 후 30~60분 내 발기 효과가 나타나며, 지속 시간은 약 4~5시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레비트라가 음식물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자연스러운 발기를 지원하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다른 PDE5 억제제와 병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레비트라 50mg구입비아그라구매 사이트 혜택
비아그라구매 사이트는 레비트라 50mg구입을 원하는 분들에게 100 정품을 보장합니다. 또한 11 반 값 특가 이벤트, 추가 5 할인, 사은품 칙칙이, 여성흥분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담시간은 08:30 ~ 24:00로, 개인 체질과 상황에 맞춘 안전한 복용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아몰, 시알리스제조사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 바쁜 일상에도 부담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성관계의 중요성
발기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닌, 자신감과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 고객은 말합니다.40대 초반, 체력과 자신감 모두 떨어졌지만, 레비트라 덕분에 아내와의 친밀함이 회복됐습니다.
단순한 발기 보조제를 넘어, 관계 회복의 동반자였습니다.정기적인 성생활과 발기력 유지가 부부 사이의 신뢰와 행복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남성 활력을 높이는 생활습관
운동: 조깅, 수영, 웨이트 등 유산소근력 운동으로 혈류 개선
식습관: 굴, 마늘, 부추, 아보카도 등 정력 강화 음식 섭취
수면: 규칙적인 수면으로 남성 호르몬 균형 유지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 여행 등으로 심리적 부담 해소
레비트라와 건강한 생활습관을 병행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복용 후기다시 불타오른 열정
30대 후반, 자신감이 떨어졌지만 레비트라 50mg을 복용하고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자연스럽고 강한 발기 덕분에 성생활뿐 아니라 삶의 자신감까지 회복했습니다.레비트라는 단순한 약이 아닌, 남성의 자신감과 부부관계 회복을 돕는 동반자입니다.
마무리불타는 사랑 재점화
발기력 회복은 단순 기능 회복이 아니라, 자신감과 사랑을 되살리는 시작입니다. 비아그라구매 사이트에서 레비트라 50mg구입으로 정품과 안전, 다양한 혜택까지 경험하며 당신의 활력과 사랑을 회복하세요.
기자 admin@gamemong.info
전국의 도서관을 여행합니다. 도서관 노동자인 저에게 도서관은 삶의 일터이자 쉼터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풍경, 냄새, 그리고 사소하지만 반짝이는 순간들을 글로 옮깁니다. 낯선 도시에서 발견한 도서관의 매력, 그 안에 깃든 웃음과 감동, 삶의 온기를 캐리어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책과 사람을 잇는 여행이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자말>
[이인자 기자]
"어디서 '가을 똥' 냄새가 나는 거 같지 않아?""흠, 난 잘 모르겠는데… 가을 똥 냄새는 무슨 냄새야?"
지난 9월 중순, 처음 뽀빠이릴게임 춘천시립도서관을 찾았다. 도서관 산책자가 되어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향할 때였다. 출입문을 나서는데 중년 여자들의 대화가 바람처럼 내게 실려 왔다. '똥'이라는 단어에 한 번 솔깃하고, '가을'이라는 말에 두 번 솔깃했다.
바다신2다운로드
▲ 춘천시립도서관 도서관 외관
ⓒ 이인자
'가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똥 냄새라니…'
나는 들키지 않으려 살짝 고개를 돌려서 공기를 들이마셨다. 얕게 한 번, 깊게 또 한 번. 아무리 숨을 쉬어도 가을 똥 냄새는 나지 않았다. 내 코끝엔 여전히 늦여름의 푸른 냄새만 남아 있었다. 그 냄새가 궁금했다. 혹시 앞서가던 누군가가 방귀를 뀌고 달아난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발동하던 순간 가을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똥 냄새를 맡았다는 이용자가 말을 이었다.
9월과 11월, 두 번이나 간 곳
"왜, 가을에만 나는 냄새 있잖아… 정말 몰라?"
'몰라. 진짜 몰라.'
하마터면 내가 대답할 뻔했다. 그때 알았다. 가을은 눈으로만 느끼는 계절이 아니라, 코로도 느끼는 계절이라는 걸. 가을을 즐기는 새로운 골드몽사이트 감각이 그날 처음 피어났다. 나도 이번 가을엔 '후각으로 가을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11월 초, 다시 춘천시립도서관을 찾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이는 산의 빛깔은 한층 짙어졌다. 춘천에는 도서관이 여럿 있지만,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 중 하나는 넓은 주차장 때문이다. 도서관을 다니다 보면 늘 아쉬운 게 주차 문제다. 문화 행사라도 열리는 날이면 주차장은 금세 만원이다.
그런 점에서 춘천시립도서관은 여유롭다. 넓고, 게다가 무료다. 덕분에 도서관 산책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춘천시립도서관은 '장난감 도서관'으로도 유명하다. 실제로 가보니 키즈카페를 방불케 하는 대형 놀이 공간이 있었다. 내가 방문한 날은 평일이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진 못했지만, 주말이면 많은 가족들이 찾는다고 했다.
자료실 문을 열었다. 나는 도서관이 직장인 사람이다.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방문하면 본능적으로 도서의 정렬 상태부터 보게 된다. 일종의 직업병이다. 쓰러진 책을 세우고, 잘못 꽂힌 책을 제자리에 돌려 놓는 일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출간된 소설이 일반 서가에 잘못 꽂혀 있었다. 나도 모르게 책을 집어 들고, 신간 서가로 향했다.
도서의 정렬을 보는 마음은 늘 복잡하다. 너무 반듯하면 한 권쯤 일부러 비스듬히 눕혀두고 싶고, 너무 들쑥날쑥하면 손바닥으로 다독이며 줄을 세워주고 싶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책의 배열이 아니라, 마음의 배열이다. 수천 권의 책 중 단 한 권이 누군가의 마음에 꽂히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정렬일 것이다.
춘천시립도서관을 찾을 때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호반의 도시'라는 이름처럼 윤슬이 반짝이는 강변 풍경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이 도서관은 강가가 아닌 숲 속에 있다. 그렇다고 울창한 숲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다. 대신, 그보다 다정한 비밀 공간이 있다.
바로 도서관 옆 '무장애 도시 숲'이다. 가파른 산비탈을 긴 데크로 잇는 길.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시 설계다. 나는 '무장애'라는 단어 앞에서 한동안 걸음을 멈췄다. 어떤 장애물도 없이,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의 품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무장애 도시 숲 가파른 산기슭도 누구나 오를 수 있다.
ⓒ 이인자
3층 자료실에는 춘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의 안내판이 있었다. 작가를 향한 예우 같았지만, 동시에 도시의 자부심이었다. 윤대녕, 전상국, 이외수, 안정효… 문학 청년 시절 나를 흔들던 이름들이 보였다. 그러나 이 수많은 작가 중에 춘천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는 단연 '김유정'이었다.
김유정의 도시
처음으로 춘천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노래 때문인지, 교과서에서 읽은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동백꽃>을 읽고 기억하는 한 문장 만큼은 또렷하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이성의 존재가 TV 속 연예인이 전부였던 사춘기 시절, 쾨쾨한 만원 버스 안에서 알싸한 향기가 나는 이성을 찾기란 어려웠다. 흐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퍽 쓰러진 점순이의 로맨스가 너무 부러웠다.
드디어 3층 서가에서 오래전에 발행된 김유정의 책을 찾았다. 책 표지를 보는 순간, 오래된 일기장을 펼친 듯 얼굴이 화끈거렸다. 밀봉된 추억 하나가 조심스레 해제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표지를 넘기자마자 추억의 엄숙함은 깨졌다.
목차부터 낙서가 보였기 때문이다. 어떤 작품엔 주황색 사인펜 밑줄이, 어떤 작품엔 연필로 체크 표시가 있었다. 낙서가 있음에도 희귀본이라 비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누군가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것 같아 친근했다(그래도 낙서하란 말은 아니다).
▲ 김유정 단편선 동백꽃 목차에 친근한 낙서
ⓒ 이인자
몇 장을 더 넘기자 머리카락 한 올이 책갈피처럼 끼어 있었다. 도서관에서 반납된 책을 정리하다 보면 머리카락은 흔한 발견이다. 마트 영수증, 신용카드, 생일 엽서, 심지어 재산세 고지서까지 책과 함께 반납 된다. 머리카락의 얇은 굵기로 보아 중년의 머리카락 같았다. 동병상련의 마음이었을까, <동백꽃>을 읽던 시절의 그리움이었을까. 코끝까지 올라오는 뭉클함을 간신히 눌렀다.
김유정을 품은 도시답게 춘천에는 김유정 문학촌이 있다. 도서관 산책을 마친 뒤에는 이곳을 함께 들러보길 권한다. 물론, 그사이 식사 시간이 존재한다면 닭갈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닭갈비의 고장'답게, 맛없는 집을 찾기란 오히려 어렵다. 김유정 문학촌에는 청년 작가의 짧지만 뜨거운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유정은 수필 <오월의 산골짜기>에서 자신의 고향을 이렇게 썼다.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서 한 이십 리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들어 가면 내닫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앞뒤 좌우에 굵직굵직한 산들이 빽둘러섰고 그 속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산에 묻힌 모양이 마치 옴팍한 떡시루 같다고 하여 동명을 실레라 부른다."
▲ 김유정 문학촌 김유정 생가
ⓒ 이인자
가을에 도서관을 찾는다는 것
실레 마을. 토속적이면서도 어딘가 이국적인 이름이라 생각했다. 문학촌 곳곳에는 작품 속 장면들이 조각되어 있었고, 전시관 내부에는 젊은 작가의 열정과 가난, 병마와 싸운 고독이 남아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유정이 친구 안회남에게 보낸 편지였다. 병이 깊어지고 있었다. 번역거리를 보내주면 그 돈으로 '닭 30마리, 살모사, 구렁이 100마리'를 먹고 다시 살아나겠다고 했다. 삶과 죽음, 문학에 대한 결연한 의지 앞에서 숙연해졌다. 그렇게 그는 스물아홉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춘천에서의 하루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차에 타기 전, 전시관 옆 화장실에 들렀다. 그때였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 왔다. 덜 마른 나뭇잎 향기 같기도 하고, 화장실 특유의 냄새 같기도 했다. 혹시 이것이 가을 똥 냄새였을까. 잠들어 있던 후각을 톡 하고 깨우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오래오래 맡고 싶었지만, 손을 씻고 나오자 그 냄새도 사라졌다. 아쉬웠다.
공공 도서관에서 일하지만, 가을이라고 해서 도서관 이용자가 늘어났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 아름다운 계절의 유혹을 물리치고 도서관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나는 가을에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을 진짜 '도서관 덕후'라 부르고 싶다. 그들은 아마도 이 계절의 단풍이 책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 것이다.
내면의 단풍을 더 아름답게 물들이고 싶다면, 아름다운 계절에 도서관 산책자가 되어보길 권한다. 그리고 도서관 문을 나설 땐, 바람에 실려 온 가을 똥 냄새를 맡는 행운도 누리시기를.
덧붙이는 글
[이인자 기자]
"어디서 '가을 똥' 냄새가 나는 거 같지 않아?""흠, 난 잘 모르겠는데… 가을 똥 냄새는 무슨 냄새야?"
지난 9월 중순, 처음 뽀빠이릴게임 춘천시립도서관을 찾았다. 도서관 산책자가 되어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향할 때였다. 출입문을 나서는데 중년 여자들의 대화가 바람처럼 내게 실려 왔다. '똥'이라는 단어에 한 번 솔깃하고, '가을'이라는 말에 두 번 솔깃했다.
바다신2다운로드
▲ 춘천시립도서관 도서관 외관
ⓒ 이인자
'가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똥 냄새라니…'
나는 들키지 않으려 살짝 고개를 돌려서 공기를 들이마셨다. 얕게 한 번, 깊게 또 한 번. 아무리 숨을 쉬어도 가을 똥 냄새는 나지 않았다. 내 코끝엔 여전히 늦여름의 푸른 냄새만 남아 있었다. 그 냄새가 궁금했다. 혹시 앞서가던 누군가가 방귀를 뀌고 달아난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발동하던 순간 가을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똥 냄새를 맡았다는 이용자가 말을 이었다.
9월과 11월, 두 번이나 간 곳
"왜, 가을에만 나는 냄새 있잖아… 정말 몰라?"
'몰라. 진짜 몰라.'
하마터면 내가 대답할 뻔했다. 그때 알았다. 가을은 눈으로만 느끼는 계절이 아니라, 코로도 느끼는 계절이라는 걸. 가을을 즐기는 새로운 골드몽사이트 감각이 그날 처음 피어났다. 나도 이번 가을엔 '후각으로 가을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11월 초, 다시 춘천시립도서관을 찾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이는 산의 빛깔은 한층 짙어졌다. 춘천에는 도서관이 여럿 있지만,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 중 하나는 넓은 주차장 때문이다. 도서관을 다니다 보면 늘 아쉬운 게 주차 문제다. 문화 행사라도 열리는 날이면 주차장은 금세 만원이다.
그런 점에서 춘천시립도서관은 여유롭다. 넓고, 게다가 무료다. 덕분에 도서관 산책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춘천시립도서관은 '장난감 도서관'으로도 유명하다. 실제로 가보니 키즈카페를 방불케 하는 대형 놀이 공간이 있었다. 내가 방문한 날은 평일이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진 못했지만, 주말이면 많은 가족들이 찾는다고 했다.
자료실 문을 열었다. 나는 도서관이 직장인 사람이다.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방문하면 본능적으로 도서의 정렬 상태부터 보게 된다. 일종의 직업병이다. 쓰러진 책을 세우고, 잘못 꽂힌 책을 제자리에 돌려 놓는 일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출간된 소설이 일반 서가에 잘못 꽂혀 있었다. 나도 모르게 책을 집어 들고, 신간 서가로 향했다.
도서의 정렬을 보는 마음은 늘 복잡하다. 너무 반듯하면 한 권쯤 일부러 비스듬히 눕혀두고 싶고, 너무 들쑥날쑥하면 손바닥으로 다독이며 줄을 세워주고 싶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책의 배열이 아니라, 마음의 배열이다. 수천 권의 책 중 단 한 권이 누군가의 마음에 꽂히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정렬일 것이다.
춘천시립도서관을 찾을 때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호반의 도시'라는 이름처럼 윤슬이 반짝이는 강변 풍경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이 도서관은 강가가 아닌 숲 속에 있다. 그렇다고 울창한 숲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다. 대신, 그보다 다정한 비밀 공간이 있다.
바로 도서관 옆 '무장애 도시 숲'이다. 가파른 산비탈을 긴 데크로 잇는 길.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시 설계다. 나는 '무장애'라는 단어 앞에서 한동안 걸음을 멈췄다. 어떤 장애물도 없이,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의 품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무장애 도시 숲 가파른 산기슭도 누구나 오를 수 있다.
ⓒ 이인자
3층 자료실에는 춘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의 안내판이 있었다. 작가를 향한 예우 같았지만, 동시에 도시의 자부심이었다. 윤대녕, 전상국, 이외수, 안정효… 문학 청년 시절 나를 흔들던 이름들이 보였다. 그러나 이 수많은 작가 중에 춘천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는 단연 '김유정'이었다.
김유정의 도시
처음으로 춘천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노래 때문인지, 교과서에서 읽은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동백꽃>을 읽고 기억하는 한 문장 만큼은 또렷하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이성의 존재가 TV 속 연예인이 전부였던 사춘기 시절, 쾨쾨한 만원 버스 안에서 알싸한 향기가 나는 이성을 찾기란 어려웠다. 흐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퍽 쓰러진 점순이의 로맨스가 너무 부러웠다.
드디어 3층 서가에서 오래전에 발행된 김유정의 책을 찾았다. 책 표지를 보는 순간, 오래된 일기장을 펼친 듯 얼굴이 화끈거렸다. 밀봉된 추억 하나가 조심스레 해제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표지를 넘기자마자 추억의 엄숙함은 깨졌다.
목차부터 낙서가 보였기 때문이다. 어떤 작품엔 주황색 사인펜 밑줄이, 어떤 작품엔 연필로 체크 표시가 있었다. 낙서가 있음에도 희귀본이라 비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누군가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것 같아 친근했다(그래도 낙서하란 말은 아니다).
▲ 김유정 단편선 동백꽃 목차에 친근한 낙서
ⓒ 이인자
몇 장을 더 넘기자 머리카락 한 올이 책갈피처럼 끼어 있었다. 도서관에서 반납된 책을 정리하다 보면 머리카락은 흔한 발견이다. 마트 영수증, 신용카드, 생일 엽서, 심지어 재산세 고지서까지 책과 함께 반납 된다. 머리카락의 얇은 굵기로 보아 중년의 머리카락 같았다. 동병상련의 마음이었을까, <동백꽃>을 읽던 시절의 그리움이었을까. 코끝까지 올라오는 뭉클함을 간신히 눌렀다.
김유정을 품은 도시답게 춘천에는 김유정 문학촌이 있다. 도서관 산책을 마친 뒤에는 이곳을 함께 들러보길 권한다. 물론, 그사이 식사 시간이 존재한다면 닭갈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닭갈비의 고장'답게, 맛없는 집을 찾기란 오히려 어렵다. 김유정 문학촌에는 청년 작가의 짧지만 뜨거운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유정은 수필 <오월의 산골짜기>에서 자신의 고향을 이렇게 썼다.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서 한 이십 리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들어 가면 내닫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앞뒤 좌우에 굵직굵직한 산들이 빽둘러섰고 그 속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산에 묻힌 모양이 마치 옴팍한 떡시루 같다고 하여 동명을 실레라 부른다."
▲ 김유정 문학촌 김유정 생가
ⓒ 이인자
가을에 도서관을 찾는다는 것
실레 마을. 토속적이면서도 어딘가 이국적인 이름이라 생각했다. 문학촌 곳곳에는 작품 속 장면들이 조각되어 있었고, 전시관 내부에는 젊은 작가의 열정과 가난, 병마와 싸운 고독이 남아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유정이 친구 안회남에게 보낸 편지였다. 병이 깊어지고 있었다. 번역거리를 보내주면 그 돈으로 '닭 30마리, 살모사, 구렁이 100마리'를 먹고 다시 살아나겠다고 했다. 삶과 죽음, 문학에 대한 결연한 의지 앞에서 숙연해졌다. 그렇게 그는 스물아홉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춘천에서의 하루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차에 타기 전, 전시관 옆 화장실에 들렀다. 그때였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 왔다. 덜 마른 나뭇잎 향기 같기도 하고, 화장실 특유의 냄새 같기도 했다. 혹시 이것이 가을 똥 냄새였을까. 잠들어 있던 후각을 톡 하고 깨우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오래오래 맡고 싶었지만, 손을 씻고 나오자 그 냄새도 사라졌다. 아쉬웠다.
공공 도서관에서 일하지만, 가을이라고 해서 도서관 이용자가 늘어났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 아름다운 계절의 유혹을 물리치고 도서관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나는 가을에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을 진짜 '도서관 덕후'라 부르고 싶다. 그들은 아마도 이 계절의 단풍이 책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 것이다.
내면의 단풍을 더 아름답게 물들이고 싶다면, 아름다운 계절에 도서관 산책자가 되어보길 권한다. 그리고 도서관 문을 나설 땐, 바람에 실려 온 가을 똥 냄새를 맡는 행운도 누리시기를.
덧붙이는 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