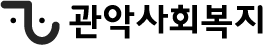체리마스터모바일 ◁ 59.rao532.top ∪ 릴게임바다신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위살림우 작성일25-11-16 17:44 조회86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96.vnu447.top
93회 연결
http://96.vnu447.top
93회 연결
-
 http://75.rcc729.top
86회 연결
http://75.rcc729.top
86회 연결
본문
【86.rao532.top】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 78.rao532.top ÷ 모바일릴게임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 73.rao532.top ☂ 황금성슬롯
릴게임뜻 ㎩ 60.rao532.top ∨ 모바일야마토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 39.rao532.top ∪ 릴짱
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
일러스트=한상엽
35년 식민 지배의 흔적인 ‘왜색(倭色)’은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았다. 창씨개명이 완료되고, 한국어 신문이 폐간된 1940년 8월 10일부터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창씨개명한 교사와 학생들이 일본어로 수업했다. 해방 이튿날 아침, 각급 학교 교장은 조회를 열고, 공식 석상에서 5년 만에 처음 쓰는 한국어로 “이제부터 나를 아마기 교장이 아니라 조 교장으로 불러달라”는 식으로 자기의 한국 이름을 소개했다. 그러고는 “전쟁은 끝났으며 오늘부터는 한국어로 수업한다”고 선언했다.
태평양전쟁 기간 내내 “일본이 릴게임신천지 전쟁에 승리해야만 한다”고 훈화하던 교장이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던 순간, 연단 아래에 서 있던 교사와 학생의 뇌리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조회가 끝난 후 교실에서는 5년 동안 써온 창씨명 대신 ‘집에서 쓰는 이름’을 소개하는 어색한 ‘통성명식(式)’이 열렸다. 교육 당국은 전날까지 소위 ‘황국 신민 교육’을 하던 바로 그 교사가 오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부터 ‘새 나라 국민 교육’을 해야 하는 낯 뜨거운 상황만큼은 덜어주기 위해 서둘러 교사들을 인근 학교로 전근 보냈다.
조선신궁은 해방 직후 스스로 해체했지만, 신사 입구에 서 있는 비석과 ‘도리이’(鳥居·신사 정문)은 해방 2년이 지난 1947년 7월에야 해체됐다./서울역 바다이야기고래 사아카이브
가장 먼저 청산된 왜색은 신사(神社)와 신궁(神宮)이었다. 1925년 남산에 들어선 조선신궁은 일본 왕실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와 메이지(明治) 일왕을 제신(祭神)으로 안치했고, 신사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관폐대사(官幣大社)였다. 해방 이튿날, 조선신궁은 해방의 환희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에 들뜬 한국인 군중이 들이닥치기 전, 신령을 돌려보내는 ‘승신식(昇神式)’을 거행하고 신사를 자진해서 폐쇄했다. 본전(本殿)은 소각하고, 부속 건물은 군정청이 인수해 경성음악학교 교사 등으로 사용했다. 해방 후에도 한참 신궁 입구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도리이’(鳥居·신사 정문)와 ‘관폐대사 조선신궁’이라 쓴 비석은 1947년 7월에야 해체됐다.
게임릴사이트서울시의 왜색 행정구역 명칭도 해방된 지 1년 이상 지나서야 사라졌다. 1946년 10월 2일, 서울시는 동명 개정을 고시하고 ‘정(町)’을 ‘동’으로, ‘통(通)’을 ‘로’로, ‘정목(丁目)’을 ‘가’로 변경했다. 동명은 합방 이전 지명으로 환원하거나 위인·명장의 이름을 붙였다. 메이지 일왕을 기념한 ‘명치정(明治町)’은 ‘명동’, 조선 주차군 사령관과 제2대 조선 총독으로 국권 침탈에 앞장섰던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기념한 ‘장곡천정(長谷川町·하세가와마치)’은 ‘소공동’, 갑신정변 당시 일본 공사였던 다케조에 신이치로를 기념한 ‘죽첨정(竹添町·다케조에마치)’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 자결·순국한 충정공 민영환을 기념한 ‘충정로’로 변경했다. ‘광화문통’이 ‘세종로’, ‘본정’이 ‘충무로’, ‘황금정’이 ‘을지로’, ‘소화통’이 ‘퇴계로’로 변경돼 한국 위인들의 이름이 수도 요지의 지명이 됐다.
해방 직후부터 일상에서 한국인들은 모두 창씨개명 이전의 이름을 썼지만, 호적과 등기부상에서 창씨명을 원래 이름으로 되돌리는 ‘조선 성명 복구령’(군정법령 제122호)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후 20일쯤 지난 1946년 10월 22일에야 공포됐다. 이 법령은 공포일부터 60일 후 신고 없이 일괄적으로 창씨개명 이전 이름으로 돌아가게 했다. 성은 되돌리더라도 개명한 이름은 그대로 쓰려는 사람과 창씨개명 이후 태어난 6세 이하 아동만 별도로 신고하게 했다. 행정적으로 창씨개명이 완전히 말소된 1947년 12월까지 남한에서만 222만여 호, 1647만여 명이 원래 이름을 회복했다. 그러나 1949년까지도 창씨명 문패를 그대로 두거나, 관공서에서 창씨명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는 사례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1946년 4월 1일부터 차량의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변경했고, 조선어 교과서 580만권을 보급하는 등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왜색을 근절하려는 공공과 민간의 노력은 지속됐다. 1947년 2월 체신부는 전보문 한글화에 성공했고, 1950년 2월에는 인왕산 암반에 조선 총독이 커다랗게 새겨둔 “대동아 청년 단결. 황기(皇記) 2599년(1939년) 9월 16일 미나미 지로(南次郞)”라는 글씨를 세금 82만원을 들여 지웠다.
이처럼 민관이 합심해 노력했음에도, 1947년 1월까지 서울중앙우체국 입구에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가 쓴 ‘京城郵便局 KEIJO POST OFFICE’ 현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1949년 10월까지 전화 교환원은 걸려온 전화를 ‘모시모시’로 응대했고, 열차 승차권 용지 배경에는 가타카나로 ‘조선 총독’이 인쇄돼 있었다. 거리마다 “긴상(김씨)” “이상(이씨)”이라는 왜색 호칭과 한국인끼리 주고받는 일본어 대화가 들렸고, 음식점 입구에는 ‘스키야키’ ‘덴푸라’ ‘오뎅’ ‘스시’ ‘텐동’ 등 일본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왜색 문화의 잔재는 청산하기까지 한 세대로도 부족할 만큼 뿌리 깊었다.
심야! 서울 한복판에 도깨비 출현! 머리 하나, 팔이 둘, 다리가 넷! 지나가는 영감님 “아이쿠, 도깨비야”하고 혼비백산. 품 안에 든 ‘할로 걸’ 왈 “하바하바 오케이” 파수하던 경관 “?” ('한성일보', 1949.1.19.)
왜색을 몰아낸 자리는 미군과 함께 진주한 ‘양풍(洋風)’이 차지했다. 아이들은 엿 대신 초콜릿과 캔디를 찾았고, 박봉 월급쟁이들도 빚을 져 가면서까지 양담배를 피워댔다. 청년들 사이에는 나팔바지와 이마를 ‘V’ 자로 밀어 올린 ‘리젠트 머리’, 그리고 웃통에 꽉 달라붙어 젖꼭지마저 두드러져 보이는 스웨터가 유행했다.
해가 저물면 밤에만 나타나는 젊은 여성이 거리를 활보했다. 조선일보에 연재한 ‘양풍 진주(進駐): 디시즈 서울 코리아’(1947.8.15.~8.22.)는 이 여성들의 외모를 “선지피를 빤 야차(夜叉)같이 새빨간 입술, 지독하게 지진 파마넌트, 지금 막 미국 영화 스크린에서 뛰어나온 듯한 기괴한 의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씹는 껌, 이상하게 불뚝 솟은 인조 젖가슴”이라 묘사했다. 미군 지프를 향해 손을 흔들며 ‘오케이’ ‘헬로’를 외치던 소위 ‘할로 걸’들은 지프가 멈추면 미군 옆에 올라타고 댄스홀에 가 ‘룸바’ ‘탱고’ ‘스윙’ 음악에 맞춰 밤새워 춤을 췄다.
근대 이후 한국 문화는 ‘음주가무’를 즐긴 전통문화에, 일본 문화와 미국 문화가 뒤섞인 혼종 문화였다. 이렇듯 한국 문화의 주체성과 고유성을 잃어가는 현실은 어느 시대에나 지탄과 자성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혼종 문화 속에서 훗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될 ‘K컬처’의 맹아가 움트고 있었다.
<참고 문헌>
‘양풍(洋風) 진주(進駐): 디시즈 서울 코리아’ (1)~(6),
35년 식민 지배의 흔적인 ‘왜색(倭色)’은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았다. 창씨개명이 완료되고, 한국어 신문이 폐간된 1940년 8월 10일부터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창씨개명한 교사와 학생들이 일본어로 수업했다. 해방 이튿날 아침, 각급 학교 교장은 조회를 열고, 공식 석상에서 5년 만에 처음 쓰는 한국어로 “이제부터 나를 아마기 교장이 아니라 조 교장으로 불러달라”는 식으로 자기의 한국 이름을 소개했다. 그러고는 “전쟁은 끝났으며 오늘부터는 한국어로 수업한다”고 선언했다.
태평양전쟁 기간 내내 “일본이 릴게임신천지 전쟁에 승리해야만 한다”고 훈화하던 교장이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던 순간, 연단 아래에 서 있던 교사와 학생의 뇌리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조회가 끝난 후 교실에서는 5년 동안 써온 창씨명 대신 ‘집에서 쓰는 이름’을 소개하는 어색한 ‘통성명식(式)’이 열렸다. 교육 당국은 전날까지 소위 ‘황국 신민 교육’을 하던 바로 그 교사가 오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부터 ‘새 나라 국민 교육’을 해야 하는 낯 뜨거운 상황만큼은 덜어주기 위해 서둘러 교사들을 인근 학교로 전근 보냈다.
조선신궁은 해방 직후 스스로 해체했지만, 신사 입구에 서 있는 비석과 ‘도리이’(鳥居·신사 정문)은 해방 2년이 지난 1947년 7월에야 해체됐다./서울역 바다이야기고래 사아카이브
가장 먼저 청산된 왜색은 신사(神社)와 신궁(神宮)이었다. 1925년 남산에 들어선 조선신궁은 일본 왕실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와 메이지(明治) 일왕을 제신(祭神)으로 안치했고, 신사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관폐대사(官幣大社)였다. 해방 이튿날, 조선신궁은 해방의 환희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에 들뜬 한국인 군중이 들이닥치기 전, 신령을 돌려보내는 ‘승신식(昇神式)’을 거행하고 신사를 자진해서 폐쇄했다. 본전(本殿)은 소각하고, 부속 건물은 군정청이 인수해 경성음악학교 교사 등으로 사용했다. 해방 후에도 한참 신궁 입구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도리이’(鳥居·신사 정문)와 ‘관폐대사 조선신궁’이라 쓴 비석은 1947년 7월에야 해체됐다.
게임릴사이트서울시의 왜색 행정구역 명칭도 해방된 지 1년 이상 지나서야 사라졌다. 1946년 10월 2일, 서울시는 동명 개정을 고시하고 ‘정(町)’을 ‘동’으로, ‘통(通)’을 ‘로’로, ‘정목(丁目)’을 ‘가’로 변경했다. 동명은 합방 이전 지명으로 환원하거나 위인·명장의 이름을 붙였다. 메이지 일왕을 기념한 ‘명치정(明治町)’은 ‘명동’, 조선 주차군 사령관과 제2대 조선 총독으로 국권 침탈에 앞장섰던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기념한 ‘장곡천정(長谷川町·하세가와마치)’은 ‘소공동’, 갑신정변 당시 일본 공사였던 다케조에 신이치로를 기념한 ‘죽첨정(竹添町·다케조에마치)’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 자결·순국한 충정공 민영환을 기념한 ‘충정로’로 변경했다. ‘광화문통’이 ‘세종로’, ‘본정’이 ‘충무로’, ‘황금정’이 ‘을지로’, ‘소화통’이 ‘퇴계로’로 변경돼 한국 위인들의 이름이 수도 요지의 지명이 됐다.
해방 직후부터 일상에서 한국인들은 모두 창씨개명 이전의 이름을 썼지만, 호적과 등기부상에서 창씨명을 원래 이름으로 되돌리는 ‘조선 성명 복구령’(군정법령 제122호)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후 20일쯤 지난 1946년 10월 22일에야 공포됐다. 이 법령은 공포일부터 60일 후 신고 없이 일괄적으로 창씨개명 이전 이름으로 돌아가게 했다. 성은 되돌리더라도 개명한 이름은 그대로 쓰려는 사람과 창씨개명 이후 태어난 6세 이하 아동만 별도로 신고하게 했다. 행정적으로 창씨개명이 완전히 말소된 1947년 12월까지 남한에서만 222만여 호, 1647만여 명이 원래 이름을 회복했다. 그러나 1949년까지도 창씨명 문패를 그대로 두거나, 관공서에서 창씨명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는 사례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1946년 4월 1일부터 차량의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변경했고, 조선어 교과서 580만권을 보급하는 등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왜색을 근절하려는 공공과 민간의 노력은 지속됐다. 1947년 2월 체신부는 전보문 한글화에 성공했고, 1950년 2월에는 인왕산 암반에 조선 총독이 커다랗게 새겨둔 “대동아 청년 단결. 황기(皇記) 2599년(1939년) 9월 16일 미나미 지로(南次郞)”라는 글씨를 세금 82만원을 들여 지웠다.
이처럼 민관이 합심해 노력했음에도, 1947년 1월까지 서울중앙우체국 입구에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가 쓴 ‘京城郵便局 KEIJO POST OFFICE’ 현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1949년 10월까지 전화 교환원은 걸려온 전화를 ‘모시모시’로 응대했고, 열차 승차권 용지 배경에는 가타카나로 ‘조선 총독’이 인쇄돼 있었다. 거리마다 “긴상(김씨)” “이상(이씨)”이라는 왜색 호칭과 한국인끼리 주고받는 일본어 대화가 들렸고, 음식점 입구에는 ‘스키야키’ ‘덴푸라’ ‘오뎅’ ‘스시’ ‘텐동’ 등 일본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왜색 문화의 잔재는 청산하기까지 한 세대로도 부족할 만큼 뿌리 깊었다.
심야! 서울 한복판에 도깨비 출현! 머리 하나, 팔이 둘, 다리가 넷! 지나가는 영감님 “아이쿠, 도깨비야”하고 혼비백산. 품 안에 든 ‘할로 걸’ 왈 “하바하바 오케이” 파수하던 경관 “?” ('한성일보', 1949.1.19.)
왜색을 몰아낸 자리는 미군과 함께 진주한 ‘양풍(洋風)’이 차지했다. 아이들은 엿 대신 초콜릿과 캔디를 찾았고, 박봉 월급쟁이들도 빚을 져 가면서까지 양담배를 피워댔다. 청년들 사이에는 나팔바지와 이마를 ‘V’ 자로 밀어 올린 ‘리젠트 머리’, 그리고 웃통에 꽉 달라붙어 젖꼭지마저 두드러져 보이는 스웨터가 유행했다.
해가 저물면 밤에만 나타나는 젊은 여성이 거리를 활보했다. 조선일보에 연재한 ‘양풍 진주(進駐): 디시즈 서울 코리아’(1947.8.15.~8.22.)는 이 여성들의 외모를 “선지피를 빤 야차(夜叉)같이 새빨간 입술, 지독하게 지진 파마넌트, 지금 막 미국 영화 스크린에서 뛰어나온 듯한 기괴한 의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씹는 껌, 이상하게 불뚝 솟은 인조 젖가슴”이라 묘사했다. 미군 지프를 향해 손을 흔들며 ‘오케이’ ‘헬로’를 외치던 소위 ‘할로 걸’들은 지프가 멈추면 미군 옆에 올라타고 댄스홀에 가 ‘룸바’ ‘탱고’ ‘스윙’ 음악에 맞춰 밤새워 춤을 췄다.
근대 이후 한국 문화는 ‘음주가무’를 즐긴 전통문화에, 일본 문화와 미국 문화가 뒤섞인 혼종 문화였다. 이렇듯 한국 문화의 주체성과 고유성을 잃어가는 현실은 어느 시대에나 지탄과 자성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혼종 문화 속에서 훗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될 ‘K컬처’의 맹아가 움트고 있었다.
<참고 문헌>
‘양풍(洋風) 진주(進駐): 디시즈 서울 코리아’ (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